보내는 기사
[이원의 시 한 송이] 가난한 가을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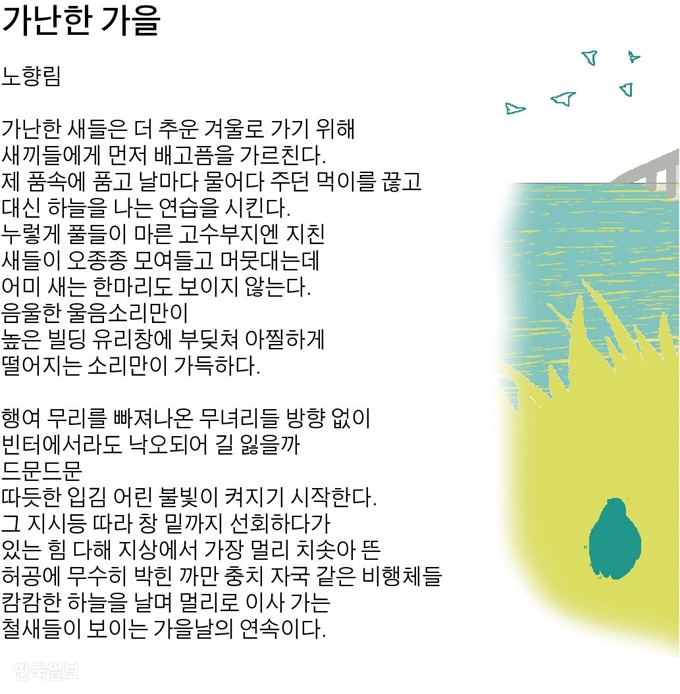
노향림 시인을 대표하는 것은 ‘묘사시’지요. 1970년 데뷔한 이후 내내 ‘언어로 그리는 그림’을 그려왔지요. “한겨울 깊은 땅속에 파묻힌 씨앗이 봄에 움”(‘푸른편지’ 시인의 말)틀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품는 시선에서 비롯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발견의 눈이었고 닿는 눈이었던 시인은 이제 만지는 눈에 이르렀지요.
가을은 ‘자발적 가난함’이지요. 익숙한 시선으로 보면 스스로 잃어버리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시선으로 보면 ‘원래’가 되는 것이지요. 풀은 초록을 살아보았으니 갈색으로 옮겨가요. 새는 떠나온 곳이 있으니 돌아가요. 풀과 새는 같은 성질이라고 느껴져요. 소란스럽지 않게 휘고 감으면서 서로가 되었다가, 풍경을 함께 지워요. 가난한 시선이어서 보탤 것도 숨길 것도 없어요.
이 가을, 캄캄한 허공과 새가 어둠의 어디쯤에서 몸 겹치는지, 철새라는 비행체들이 지상에서 가장 멀리 치솟을 때 하늘은 어디까지 물러서 주는지 보고 싶다면, 시인의 시선을 따라 가난한 가을의 어딘가에 한동안 머물러 보기로 해요. 시선이 “따듯한” 온도로 데워지면 닿은 눈에 힘입어 손으로도 만져보기로 해요.
‘따듯’은 묘사시의 온도지요. 계속 유지되는 일정한 온도지요. 그 대상이 사물이든 타인이든 나이든, 무녀리들이 혼자서도 내일을 떠올려 볼 수 있을 만큼, 완전히 길을 잃지는 않을 만큼, 대수롭지 않게, 일명 ‘츤데레’의 시선으로 닿아주기 좋은 계절이에요. 맨 먼저 나온 새끼를 이르는 말인 무녀리는 좀 부족한 사람을 비유할 때도 쓰지요. “새끼들에게 먼저 배고픔을 가르치는” 엄마도, 또 우리 모두도, 아마 무녀리에서 비롯되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 안에 ‘따듯’이라는 “시의 씨앗”이 들어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원 시인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