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이원의 시 한 송이] 산동반점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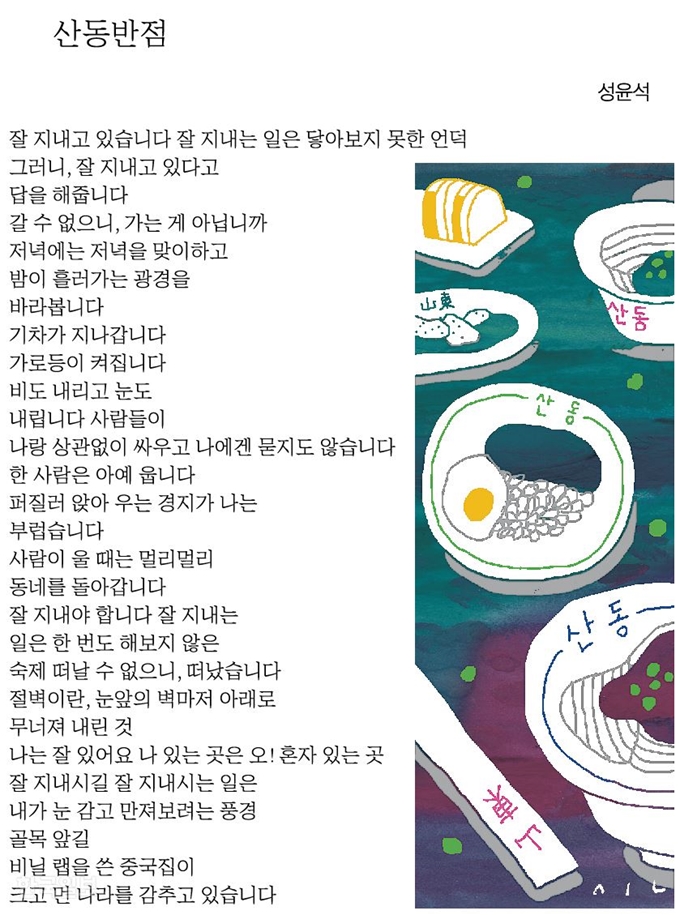
가장 많이 건네는 인사에는 어김없이 ‘잘’ 이라는 부사가 들어가지요. ‘잘 지내지?’ 라고 묻고, ‘잘 지내’라고 답하지요. ‘잘’은 균형과 실패 없음을 가리키지요. ‘잘’은 결국 내게 돌아오는 공이지요. 내가 수행해내야만 하는 것이지요. “크고 먼 나라를 감추고 있”는 이 만능의 외마디는, 그래서, 잘 있다는 답이 오면, 잘 지내는구나로 여기게 하지요. ‘잘’이 들어가는 인사는 가장 평범한 인사, 가장 무난한 인사이기도 한데 말이죠.
나는 잘 지내는 언덕에 닿아본 적이 없어서 잘 지내라고 대답하는, 아니 대답할 수밖에 없는 사람. 고를 수 있는 다른 말이 남아 있지 않거든요. 나는 ‘잘’로 물어왔기 때문에 ‘잘’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갈 수 없으니 가는, 떠날 수 없으니 떠나게 된, 애가 끓는, 애가 타는, 애가 끊어지는 시간을 겪었거든요. 나는 나와 상관있는 일을 두고 나랑 상관없이 싸우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 그 풍경에서 지워져야 하는 존재가 된 사람. 퍼질러 앉아 울 수 있는 사람도 못되기에 그렇게 우는 사람을 보면 멀리 멀리 돌아가요. 그 울음을 보호해주고 싶거든요. 무심한 듯 오래전부터 동네를 지켜주고 있는 산동반점처럼요.
절벽을 경험하고 절벽에서 솟아난 사람이라면, 최후의 벽이 무너져 내릴 때 내가 딛고 있는 곳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을 알게 된 존재이지요. 그래서 산동반점에 랩을 씌우는 마음은 내가 눈 감고도 만져보고 싶은 절박함과 같다는 것을, 쉽게 벗겨지고 찢기는 비닐 랩이 바로 ‘잘’의 구체성, 건네는 온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산동반점은 마포에 성남에 목포에 속초에 구미에도 있어요. 멀고 큰 나라는 가까운 곳에 들어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존재의 힘든, 어려운 시간을 알게 된다면, 다른 인사를 건네 보기로 해요. 랩을 씌우는 마음. 그 존재의 절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의 힘을 조금씩 보태주기로 해요. 절박한 인사만이 절박한 존재에게 닿을 수 있어요. ‘질문이 달라지면 대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잘’의 자리에 ‘잘’ 말고 ‘잘’의 구체성을 담아 건네면, ‘잘’을 보호할 수 있어요. 존재는 살 수 있어요.
이원 시인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