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다시 본다, 고전] 생각이 태어나기 전 마음의 형상, 그게 시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어쩐지 펼쳐 보기 두려운 고전을 다시 조근조근 얘기해 봅니다. 작가들이 인정하는 산문가, 박연준 시인이 4주마다 ‘한국일보’에 글을 씁니다
<27>페르난두 페소아 ‘시는 내가 홀로 있는 방식’

페소아(1888-1935)를 그린 적이 있다. 심심한 오후였고, 딱히 할 일이 없었다. 비뚜름히 쓴 모자를 그리고, 안경을 그리고, 몽환적으로 보이는 눈빛을 그리고, 기다란 코, 입술, 감색 양복을 그렸다. 그림 아래에 그가 쓴 문장을 적었다.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밤이 오고 마차가 도착하리라.” 그의 문장은 설명 없이, 모든 것을 알게 한다.
문학은 설명이 아니다. 설명하지 않은 글이 있다면, 그게 문학과 가장 가까운 글일 테다. 그 중 ‘시’가 가장 설명을 싫어한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는 설명을 증오한다. 시는 ‘생각으로 쌓은 성’을 단 몇 줄만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
“생각한다는 건/ 바람이 세지고, 비가 더 내릴 것 같을 때/ 비 맞고 다니는 일처럼 번거로운 것.// 내게는 야망도 욕망도 없다./ 시인이 되는 건 나의 야망이 아니다. / 그건 내가 홀로 있는 방식.” ‘양떼를 지키는 사람’ (11쪽)
시인은 직업이 될 수 없고, 야망이나 출세 수단이 될 수 없다. 시인이란 그저 누군가가 “홀로 있는 방식”이 될 뿐이다. 조금이라도 ‘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시집을 펴고 몇 장 넘기지 않아 놀랄 것이다. 스무 페이지를 지나지 않아 반 즈음 넋이 나가있는 자신을 볼지도 모른다. (내가 그랬다.) 페소아가 말하듯 예언할 때, 예언하듯 속삭일 때, 속삭이듯 선언할 때, 선언하듯 노래할 때 읽는 이는 매료될 것이다.
“나는 마치 금잔화를 믿듯 세상을 믿는다,/ 왜냐하면 그걸 보니까.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은 이해하지 않는 것이니……/ 세상은 생각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생각한다는 건 눈이 병든 것)/ 우리가 보라고 있고, 동의하라고 있는 것.”(16-17쪽)

흔히 시인을 견자(見者)라 한다. 보는 사람. 정확히는 다르게 보는 사람. 눈으로 세상을 압인하여, 언어로 재창조하는 사람. 페소아는 자신이 본 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믿는다고 쓴다. 세상이 생각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듯, 시 또한 이해를 위한 장르가 아니다. 보고, 받아들이면 충분한 예술이다. 우리가 나무나 구름, 장미를 받아들이고 좋아하듯이.
“내겐 철학이 없다, 감각만 있을 뿐”이라고 쓴 페소아에게 심오한 철학이 없는 건 아닐 테다. 시의 세계에선 ‘의미, 생각, 이해, 논리’ 따위보다 감각과 직관의 힘이 더 세다는 이야기다. 시인은 감각과 직관으로 세상을 꿰뚫어 보는 자들이므로. “그걸 사랑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것”, 이상하지만 너무 알 것 같은 이 논리! 이 시집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사랑한다는 것은 순진함이요, /모든 순진함은 생각하지 않는 것……” (17쪽)
사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순진하지 않은 사람이다. 생각을 멈추지 않는 사람, 이해를, 앎을, 계산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다. 화가 세잔 역시 “생각이 모든 것을 망친다”고 하지 않았던가. 어쩌면 시의 세계에서 생각은 바보들의 무기일지 모른다. 페소아의 시에는 시의 원형, 언어가 움트기 전의 에너지, 생각이 탄생하기 전 마음의 형상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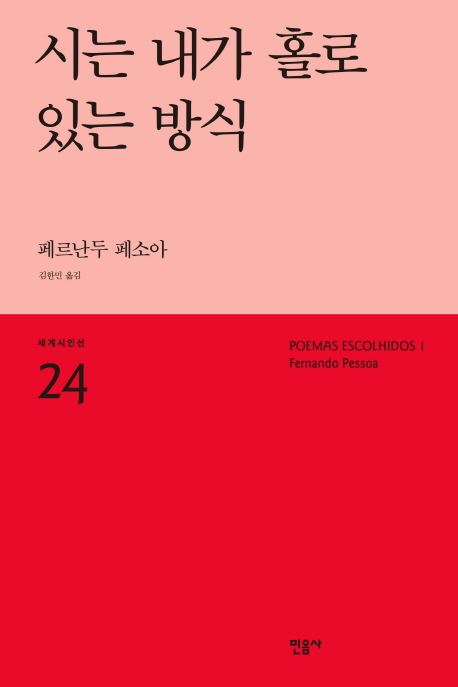
시는 내가 홀로 있는 방식
페루난두 페소아 지음ㆍ김한민 옮김
민음사 발행ㆍ268쪽ㆍ1만2,000원
페소아는 사후 방대한 양의 미완성 글을 남겼다. 여섯 살 때부터 이명(異名)을 써온 그는 평생 일흔 개가 넘는 ‘다른 이름’을 사용해 글을 썼다. 각각의 이름은 취향과 성격도 제 각각이었기에, 페소아 연구자들은 지금도 연구에 매달리고 있다고 한다. 페소아에게 이토록 많은, 서로 다른 캐릭터가 필요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자신을 드러내면서 도망가기, 달아나면서 보여주기, 다른 방식으로 말하기 위해서였을까. 페소아는 이름과 이름 사이를 옮겨가며, 보는 ‘눈(目)’을 바꿔 사용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럴 가치가 있었냐고? 모든 것은 가치가 있다/ 영혼이 작아지지만 않는다면.” (187쪽)
박연준 시인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