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미치지 않으려고, 덜 미치려고 시를 쓴다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어쩐지 펼쳐 보기 두려운 고전을 다시 조근조근 얘기해 봅니다. 작가들이 첫손에 꼽는 산문가, 박연준 시인이 <한국일보> 에 격주 금요일 글을 씁니다.

앤 섹스턴. ⓒARTHUR FURST
시를 읽는 일은 이상한 일이다. 뚜렷한 메시지를 기대할 수 없고 정보나 지식을 구한다는 보장도 없이 언어를 마주해야 한다. 운이 나쁘면 몇 페이지를 넘기는 동안 마음을 건드리는 문장을 찾지 못할 위험이 있고, 운이 좋다고 해도 ‘아, 좋다!’ 하고 탄식하는 일 외에는 딱히 소용 있는 일이 벌어지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 ‘아 좋다!’고 탄식하는 일이 다른 어떤 독서와도 다른 경험을 준다. 시를 읽는 자는 이 경험(놀람, 영혼의 일렁임, 두근거림)을 찾아 헤매는 사냥꾼으로 살게 된다. 존 버거는 사냥을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행위이다. 그것은 무언가를 넘어서는 것이다. 광야로 돌진하는 것. 그것은 고개를 곧추세운 채 여우를 내려다보는 사냥개처럼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G', 54쪽)이라고 했다. 정확하다. 시를 읽거나 쓰는 일은 우리가 정말 되어야 한다고 믿는 무언가가 될 수 있게 한다. 시 속에서.
앤 섹스턴의 시들은 밤 사냥을 나선 영혼이 ‘모서리에 서서 마지막으로 흥얼거리는 노래’ 같다. 그가 잡으려는 최후의 사냥감은 죽음이다. 앤 섹스턴에게 죽음은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탈주로로 보였을까. 1928년 미국에서 태어나 1974년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그는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끝없이 시달렸다. 그 시기의(지금도 여전히) 여자들은 직업이 두 개 이상이었다. 원래 직업 ‘말고도’ 투철한 정신으로 복무해야 한다고 느끼는 ‘역할들’에 둘러싸여 사는 일. 앤 섹스턴은 쓰는 자아 말고도 딸이자 엄마, 가정주부 ‘역할’을 해야 했고 이를 벗어버리거나 벗기를 시도하는 작업은 언제나 ‘시’에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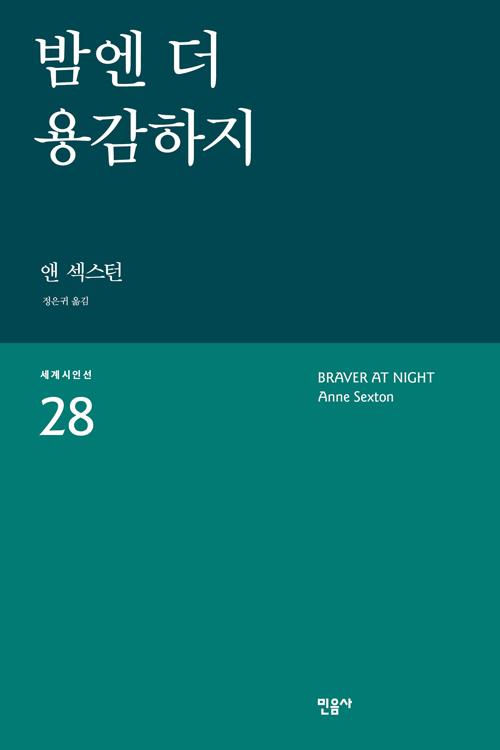
앤 섹스턴 '밤엔 더 용감하지'. 정은귀 옮김. 민음사 발행. 232쪽. 1만3,000원
“그녀는 아들을 키우는 게 아냐;/ 그녀는 몸에 짊어진 돌덩이 하나를 키우고 있어.”(69쪽)
“파멸이 내 뱃속에서 넘쳐흘러 홍수처럼 네 아기침대를,/ 내가 떠안아야 하는 오랜 빚을 채울 것처럼.”(38족)
“어떤 여자들은 집과 결혼한다./ 그것은 또 다른 종류의 피부다. 그것은 심장,/ 입, 간, 그리고 똥을 갖고 있다./ 벽은 영구적이며 분홍빛이다. /보아라, 그녀가 종일 무릎을 꿇고 앉아/ 어찌나 성실히 자신을 씻어 내리는지.” (71쪽)
“어떤 여자들은” 여성으로 ‘복무’해야 하는 인생의 가혹함에 더 많이 괴로워한다. “어떤 여자들은” 그걸 쓸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지나치게 여성성이 도드라진 시를 쓴다고 턱을 괸 채 지적하거나 ‘분열된 여성 자아’ 운운하며 진부한 비평을 하고 싶어할지 모른다. 정말 모르는 소리다. “어떤 여자들”은 시에서만이라도 분열된 자아를 합일시켜보려고 안감힘을 써보는 거다. 미치지 않으려고, 덜 미쳐보려고 시도해 보는 거다.
“유리잔은 스스로 기울고/ 저는 불이 붙어요./ 가느다란 두 줄기가 제 볼을 타고 흘러요./ 저를 바라보는 또 다른 제가 보입니다./ 저는 둘로 나누어졌네요.”(109쪽)
쓴다는 것은 저항의 시작, 고통의 유예, 유일한 자기 언어의 장을 가지는 일이다. 시 속에서 앤 섹스턴은 폭로하지 않는다. 폭로를 위해 글을 쓰는 시인은 없다. 진실을 세워두고 그걸 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전부다. 이름 없던 일에 이름을 붙이고 호명하면, 누구도 좌시할 수 없는 사건이 된다. 여성은 존재하는 일이 ‘사건’일 만큼 고단해 왔다. 안 그런가?
“나는 사랑 살인자,/ 우리 사이에 다시 또다시 불탔던 음악을/ 그리 특별히 생각했던 그 음악을 살해 중이다”고 노래한 앤 섹스턴은 그가 자조한 것처럼 “홀린 마녀”가 아니다. 홀린 마녀라고 생각한 건 그 시대의 그 사람들. 정상적인 여성상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비껴서 있는 여성을 나무랄 준비가 되어 있던 자들이다. 지금도 여전히 있다. 여성이 쓰는 시에 ‘여성 시’라는 꼬리표를 붙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